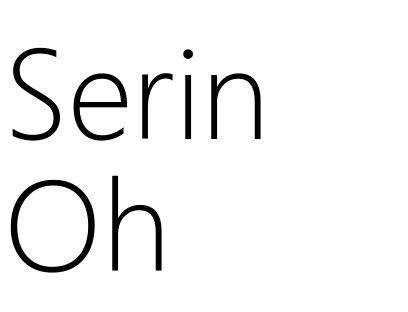Poster (How to arrange glitter and gold, Seum Art Space, 2018)
‘경계를 넘어서’라는 패션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이 패션이 되어버린 시대에 오세린의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은 눈을 씻고 볼 만하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라벨처럼 되어버린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은 뭔가 있어 보이는지 여기저기에 마구 붙여진다. 그런데 과연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기존의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경계를 뒤흔들겠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초래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말을 구호가 적힌 머리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있지도 않은 경계를 허문다면서 헛발질을 하거나 속으로는 만리장성 같은 경계를 쌓아놓고 겉으로만 허무는 척 하는 패션질을 하거나.
오세린은 어떤가. 오세린의 작업이 모종의 경계를 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떤 경계를 어떻게 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오세린의 작업은 미술과 공예의 경계를 넘나든다. 고급과 저급의 경계를 넘나든다. 오브제와 개념예술의 경계를 넘나든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이런 작업을 하는가일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이러한 작업은 상당히 진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듯하다. 오세린은 ‘개념 있는’ 예술가인 것이다.
예술가가 개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세린의 작업을 보면 그는 ‘개념 있는’ 예술가일 뿐 아니라 실제로 개념예술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은 공예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손으로 물건을 만들면 공예지만 공예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그것은 공예가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예술이 된다. 이른바 개념예술(Conceptual Art)이다. 예술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 자체를 예술의 과제로 삼는 것은 현대예술의 커다란 특징 중 하나이다. 오세린의 작업은 그것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는 공예가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개념예술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다.
“범재는 모방하고 천재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모방하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러한 명제는 예술을 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만든다. 예술을 게임에 비유하자면, 거기에는 게임을 만드는 자가 있고 게임을 즐기는 자가 있고 게임에 배팅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게임 메이커는 규칙을 만듦으로써 권력을 가진다. 플레이어는 게임을 즐김으로써 참여한다. 게임에 목을 매는 자는 게임 폐인이거나 노예이다. 게임 폐인에게 게임은 사슬일 뿐이다. 우리는 예술을 만들거나 예술을 즐기거나 예술에 속박된다. 마르셀 뒤샹은 예술을 게임으로 만든 사람이다. 앤디 워홀이나 백남준도 그렇다. 나머지는 전부 플레이어이거나 아니면 폐인이다.
Vietnam Project : invoice, 2018
공예와 예술의 어떤 상황
현대미술에서 오브제와 개념예술의 경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공예와 예술을 갈라놓는 강이 흐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강변에 높은 둑을 쌓고 어떤 이는 강을 건너다 빠져죽고 어떤 이는 강을 메워버린다. 오세린은 말하자면, 마지막에 속한다. 강을 메워버림으로써 강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현대미술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미술의 문제의식과 방법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은 올드 패션이라고 해서 이런 작업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세린은 한다. 남들이 다 알아도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이라는 천진함과 남들이 다 안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다는 뻔뻔함이 오세린의 미덕인 것 같다. 오세린의 이런 천진하고 뻔뻔한 작업은 어떤 결과 또는 효과를 낳는가.
내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한국 공예의 모순 또는 역린을 건드리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한국 공예는 예술을 지향하는데, 문제는 그 놈의 예술 추구 때문에 공예도 못되고 예술도 못되고 그냥 망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국 공예는 예술이 되고자 하면서 공예가 되기를 포기한다. 그러니 애당초 공예로서의 성공은 포기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예술로는 성공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공예의 반대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공예는 공예를 버리기만 하면 예술이 되는 줄 알지만 그건 턱도 없는 소리이다. 예술은 공예의 부정이나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가치의 추구이다. 그러니까 공예를 버리면 예술이 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착각이거나 순진한 작태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소 엉뚱하지만 <바우하우스 선언문>의 다음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예술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감이 찾아오는 드문 순간에 하늘의 은총이 그의 작업을 예술로 만들어줄 것이다.”
아무튼 한국 공예는 주제넘게 예술이 되고자 하다가 예술도 못되고 공예도 못된다. 한국 현대공예는 예술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을 기본값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그래서 실제로는 위장된 예술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예술로도 공예로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공예가 실은 공예 혐오(공예 됨을 부정하고 예술이 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에 기반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물론 이는 직시하기도 인정하기도 괴로운 진실이다. 그런데 오세린은 예술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의 작업은 공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과정에서 어떤 공예성(Craftness)을 역설적으로 획득하게 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오세린이 그렇게 획득하는 공예성이란 장인성(Craftmanship)과 예술성, 현대성과 소비문화 등등의 현대공예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의심과 성찰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슨 대단한 장인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예의 장인성이야말로 그의 물음의 대상인 것이다.
그래서 오세린은 공예를 예술화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는 공예의 본질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진짜와 가짜, 원본과 복제, 고급과 저급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문명비판적인 제스처를 취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야말로 오세린식 공예 작업의 진면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업을 가리켜 메타 공예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공예의 궤도를 벗어난다. 그 결과 그것은 공예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업이 공예로는 실패하고 예술로는 성공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그의 작업은 이중의 역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
Exhibition view (Vietnam Project, Shinhan gallery, Yeoksam, 2018)
‘경계를 넘어서’를 패션으로 소비하지 않기
현대미술이 미술의 제작성을 부정하고 미술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미술의 목표로 삼았듯이(개념예술), 공예의 제작성을 부정하고(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예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현대공예(개념공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쨌든 공예의 전통적인 정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신체를 가지지 않은 공예를 공예라고 부를 수는 없다. 설사 미술에서는, 개념예술에서 보듯이 신체를 가지지 않더라도(신체 없는 기관)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말이다. 다만 공예가 무엇인가를 묻는 작업은 공예는 아닐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공예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한국 현대공예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앞서 말했다시피 한국 공예는 예술을 욕망할 뿐 공예가 무엇인지를 묻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현대공예는 예술에 대한 오해로 인해, 공예라는 신체 속에 예술이라는 욕망을 감금함으로써 예술을 신체화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세린은 반대로 공예의 신체성을 의심함으로써 오늘날 공예와 소비문화가 맺고 있는 음험한 관계, 나아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위계와 속물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린의 이러한 작업은 분명 현대미술에서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공예와의 관계 속으로 엮여 들어감으로써 본의 아니게 공예의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인데, 나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성취는 그의 바보스러울 정도로 천진하고 속물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으니, 어찌 이 또한 예술가에게만 가능한 어떤 덕목이라고 하지 않을쏘냐. 그의 작업이 경계를 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사실 그에게 공예인가 예술인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세린의 작업은 ‘경계를 넘어서’를 결코 패션으로 소비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