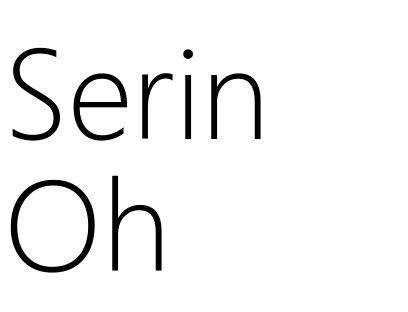흙은 무엇을 원하는가
조새미 / 미술비평, 미술학박사
- 2019년 CR collective에서 열린 단체전 <패브릭하우스 f-house>에서 선보인 <흙을 돌보는 시간>의 평론입니다. (작품보기)
- <월간도예>(1월호, 2021)에 수록, pp.86~93.
2020년 노벨 문학상은 미국 시인 루이즈 그릭Louise Glück b. 1943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시 <야생붓꽃 The Wild Iris>에서 화자는 야생붓꽃의 구근이다. 야생붓꽃의 구근은 갈라진 흙과 흙 사이에서 햇빛을 본다. 어두운 땅속에서 구근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기에 흙은 잠들게 되는 장소이기보다는 아기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깨고 나와야 할 껍질이자 빛을 향해 있는 문이다. 흙은 죽음과 삶을 동시에 인지하게 하는 경계이자 삶으로의 통로이다. 시인은 구근이 피어나는 순간이 우리가 “고통의 끝에 있는 문을 열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의 순간이라고 말한다. 인고의 시간 끝, 우리가 열게 되는 문이 바로 ‘흙’이다.
시인의 시 안에서 흙과 미술가, 조형예술가가 다루는 흙이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와 미술은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 왔다. 예를 들어 로마 공화정 말기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Quintus Horatius Flaccus B.C. 65~B.C. 8가 『시학Ars Poetica』에서 언급했던 “시는 그림과 같이ut pictura poesis”라는 고전 경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시각 문화 연구자인 미첼W. J. T. Mitchell b. 1942은 “시를 그림과 비교하는 것은 은유를 만드는 것이고, 시를 그림과 구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 라고도 했다. 그림과 도예를 같은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도예를 일상의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 가두지만 않는다면, 시와 흙을 소재로 한 예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 네 명의 작가의 작품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작가가 가지는 자유라는 특권은 흙이라는 매체와의 관계에 있어 어떻게 조정될 수 있을까? 인간은 조형예술의 재료인 흙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특권의 수혜자일 뿐인가? 우리는 흙의 속삭임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흙은 무엇을 원하는가? 흙과의 교감 없이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도예가가 있으랴만 이 글에서는 도예가의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일련의 물질적 실천으로서, 흙에 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며 흙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작가와 작품에 주목했다.
(중략)
흙의 속삭임 / 곽인식
날 것 그대로의 점토 / 피비 커밍스
시간과 「거석」/ 신미경
(중략)
흙을 돌보는 이유 / 오세린
오세린b. 1987은 액세서리를 수집해 이를 다시 조합하는 방법으로 장신구를 만들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오리지널, 복제, 모방의 함수 관계를 탐구해 왔다. 동양화와 금속공예를 전공한 작가는 2016년 저가 액세서리를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과 사람들을 찾아 중국과 베트남에서 3개월간 체류했다. “진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새들은 날기 위해 머리를 없앤다」2016~2018, 「푸톈福田을 가로지르며」 2016~2018와 같은 영상을 제작했다. 작가는 2019년 저널리스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이러한 작업에서 방향을 틀어 자신의 가족에 관한 「흙을 돌보는 시간」 2019과 「담바구」 2019를 제작했다. 이 두 작업에서 ‘흙’은 핵심적 매개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