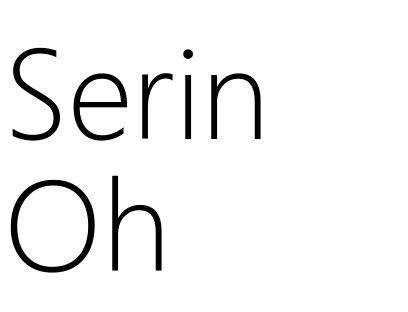경이의 여행- 큰꼬리로 헤엄쳐, 잔비늘(細鱗)로 거슬러오기
조주리 / 독립기획자, 연구자
- 2022년 바이파운드리에서 열린 개인전 <숲 온도 벙커>의 평론입니다. (작품보기)
- <숲 온도 벙커> (FOUNDLY SEOUL, 2022)에 수록, pp.57~75.
오세린의 작업에 대한 이해는 그가 속했던 세계로부터 친연성과 동질감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활동 초기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창작은 ‘잘’ 만들기 보다는 ‘다르게’ 만들기에 대한 고민, 친절한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금속 작업 <모방과 속임수> 시리즈나 거기에서 파생된 사진, 영상, 텍스트와 같은 다양한 창작적 시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 분류 체계 안으로 손쉽게 밀어 넣을 수 없는 까닭은 오세린의 작업이 갖는 담론적 힘과 개념미술로서의 분명한 가능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세린 작업의 근간은 개념과 형식의 공명에 있다. 때로, 보는 이의 시선을 단박에 붙드는 금속 조형의 그로테스크한 화려함에 대한 감각적 쏠림으로 인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내-외연의 고리를 알아차리기 어렵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의 작업들은 작가가 품고 있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입증해내고픈 가설들을 함축하는 장치다. 이를테면, 눈앞에 기이한 자태로 반짝이는 가짜 물건들을 구실삼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의 당위와 현상의 본말을 의심케하고, 호도하는 일인 것이다.
지역과 대륙 사이를 바지런히 오가며 현장을 조사하고, 물건을 수집하고, 이리저리 연구한 끝에 내놓은 오브제를 통해 작가가 분열시키고자 하는 세계란 무엇일까. 아마도 현상과 진실, 원전과 아류, 정신과 물질, 노동과 예술의 관계처럼 선후의 경계와 위, 아래의 위계를 확언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다. 다시 그것들끼리 착종되어 피아(彼我)를 분리하기 어려운 덩어리 상태가 되고, 일상의 시각 문화를 점령하고 있는 상투적인 미감이 다시 정교한 제작술을 거쳐 작품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좆는 일은 무척 흥미롭다. 따라서, 오세린 작업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특한 착상의 지점과 현상에 대한 조작적 접근, 작업 수행의 여정 안에서 전개되는 인식의 교정과 같이 다양한 시점에서의 예술적 사건들이 선재(先在)함을 폭넓게 살필 필요가 있다. 감각을 자극하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맥락적 이해를 요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이다.
Exhibition view (Forest Temperature Bunker, BYFOUNDRY, 2022
photo by Kyung Roh
그런 전제 위에서 새 전시 <숲 온도 벙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과 위상의 복잡계로 이행하는 시도라는 기대감을 준다. 리서치의 실증성과 사변적 서사의 결합, 오픈소스 데이터의 활용, 반 자연적 재료로 만든 3D조각의 물성, 그리고 그 위로 덧입혀진 조형적 미감과 같은 적층 구조는 우연과 통제, 현실과 가상의 고삐를 움직이는 전략의 능란함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결정화’되기 이전의 창작 시도이기도 하다. 얽히고 설킨 제작상의 레이어는 이번 전시를 촉발시킨 이야기 구조와 닮은 것이기도 하다. 우연한 경로로 수집하게 된 낙동강 열목어의 소멸과 귀환 서사가 갖는 허약성은 오히려 작가적 상상력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외견상 평화롭고 산세 좋은 마을 같지만 장기간 오염에 노출되었던 대현리 계곡의 역사를 조사한 후면의 이야기에는 반전 구조가 담겨 있다. 1급수 어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미 절멸한(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개체를 되살려낸 집단의 의지와 욕망, 사실은 그네들이 되살린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잔존하던 존재들이 비밀스럽게 귀환했을 지 모를 가능성에 대한 작가적 의심, 오늘날 가장 화려한 시각 문화의 전장인 아트 갤러리에서 관객과 대면하게 될 설치미술로의 도약. 긴 시간의 틈새에서 일어났던 저 너머의 사건과 지금의 순간을 오가며 짜맞춤 하다 보면 진실의 허술함 보다는 상상력의 미약함을 절감하게 된다. 오늘의 작업은 언제, 어느 곳에서 시작되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문득, 창작의 시원과 그것을 실체적인 과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그리고 작가가 인지하는 것 보다 오래 전 쏘아 올려져 이제야 당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타임 라인 사이의 우회로를 살피다 보면 하나의 긴 선분이 그어진다. 짝퉁 귀금속 제조 공장을 찾아 나섰던 베트남과 중국으로의 조사 여행이 이미 오래 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속의 원 자재가 한국으로부터 온 것을 파악하게 되고, 구체적 산지를 파고들다 보니 경상북도 봉화군에 가 닿게 된, 제법 구불구불한 작업 이야기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드는 생산과 소비의 국제적 루트는 몇 달러짜리 싸구려 반지의 교역로로 좁혀지고, 그 과정을 추적해 나가는 작가의 여정을 그간의 작품을 애써 복기해본다. 그러다 차츰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봉화의 깊은 계곡에서 낙동강으로, 또 다른 어디 쾌적한 온도를 찾아나서는 열목어 떼의 움직임과 그들이 당도한 곳의 생태환경을 서늘한 온도와 축축한 질감으로 상상해 본다.
흐르는 숲 Flowing Forest (detail), PLA, acrylic paint, glazed ceramic, 35x44x35cm, 2022
photo by Kyung Roh
생태 담론을 짚어보게 하는 전시의 제목 <숲 온도 벙커>는 첫 여행 이후 곧장 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행일 지 모른다. 한 동안 의식에서 미끄러지고, 무의식 속에서 소환되기를 반복하면서 열목어 이야기는 환경파괴나 기후 위기를 상투적으로 다루는 작업으로 흐르지 않을 당위와 대상을 가까이 재현하거나 너무 멀리 추상화시키지 않을 여유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작업을 준비하면서 작가는 여러 차례의 현지 조사여행과 문헌연구, 어류학자와의 대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과정 끝에 다다른 곳은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모르는 것,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의 경계를 혼탁하게 흐림으로써 누군가의 사고 통로를 열어두는 일이었을 것이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Jules Verne)이 그려내고자 했던 ‘경이의 여행’ (Voyages extraordinaires) 시리즈처럼 작업의 이야기는 신비한 광선과 해저의 깊은 구멍, 사라진 자리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기담과 모험담이 된다.
‘또 모르지, 지금도 낙동강 어느 틈새에서 한강 열목어가 길을 찾고 있을지.’ 로 마무리되는 작업 노트를 읽으며, 나는 미약한 상상력을 끌어와 오래 전 달과 지구 사이를 오간다던 인어 종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본다. 우주를 헤엄쳐 건너, 달에서 알을 낳는다던 인어 떼와 지구 행성의 핵 오염으로 인해 전개되는 인간과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 가물가물한 예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사념으로, 과감한 몽상으로 이어진다. 커다란 꼬리로 대양을 가르던 향유 고래와 잔 비늘의 힘으로 계곡을 거슬러 오르던 열목어가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꺼진다면, 서로 뒤바뀐 위치에 가 있을까 하는 상상. 어쩌면 에베레스트 산맥만큼이나 해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 안쪽에 침잠해있던 단단한 암석덩어리가 봉화의 야트막한 계곡으로 튀어 오르고, 펄펄 끓던 베트남의 주물 공장이 시베리아 얼음 바다 아래로 잠기는 그런 상상.
백만 광년 바깥의 크립톤 행성에서 날아온 것 같은 색색의 인공 물질 덩어리를 바라보며, 나는 그것을 오늘날의 미술품이 아닌 온 존재의 ‘경이로운 여행’을 추억하는 천연 기념품이라 여겨 보기로 한다. 그것이 작가의 상상력에 대한 화답이다.